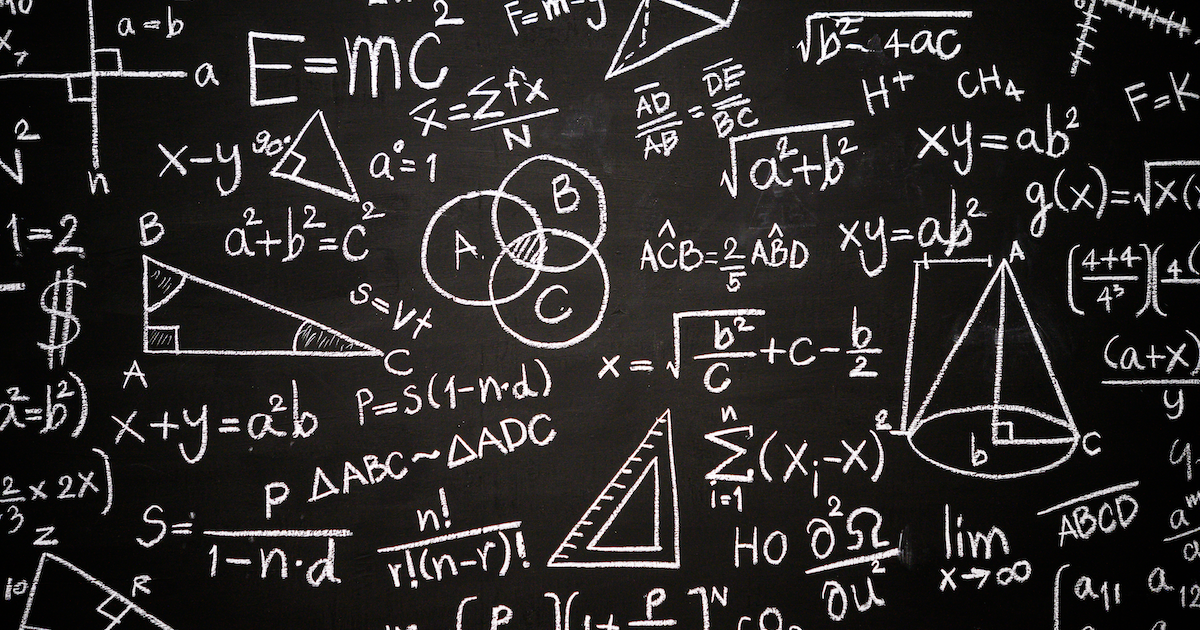수열과 급수
수열과 급수의 정의, 수열의 수렴과 발산, 급수의 수렴과 발산, 자연로그의 밑 e의 정의 등 미적분학의 기초 개념들을 살펴본다.
수열
미적분학에서 다루는 수열(sequence)은 주로 무한수열을 뜻한다. 즉, 수열이란 자연수(natural number) 전체집합
\[\mathbb{N} := \{1,2,3,\dots\}\]에서 정의된 함수이다.* 이 함수의 값들이 실수(real number)이면 ‘실수열’, 복소수(complex number)이면 ‘복소수열’, 점(point)이면 ‘점렬’, 행렬(matrix)이면 ‘행렬렬’, 함수(function)이면 ‘함수열’, 집합(set)이면 ‘집합렬’ 등으로 부를 수 있지만, 이들 모두를 간단하게 ‘열’ 또는 ‘수열’로 지칭할 수 있다.
보통 실수체(the field of real numbers) $\mathbb{R}$에 대하여, 수열 $\mathbf{a}: \mathbb{N} \to \mathbb{R}$에서
\[a_1 := \mathbf{a}(1), \quad a_2 := \mathbf{a}(2), \quad a_3 := \mathbf{a}(3)\]등으로 두고, 이 수열을
\[a_1,\, a_2,\, a_3,\, \dots\]또는
\[\begin{gather*} (a_1,a_2,a_3,\dots), \\ (a_n: n=1,2,3,\dots), \\ (a_n)_{n=1}^{\infty}, \qquad (a_n) \end{gather*}\]등으로 나타낸다.
*수열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정의역을 자연수 전체집합 $\mathbb{N}$ 대신 $0$ 이상의 정수 집합
\[\mathbb{N}_0 := \{0\} \cup \mathbb{N} = \{0,1,2,\dots\}\]또는
\[\{2,3,4,\dots \}\]등으로 잡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듭제곱급수 이론을 다룰 때는 정의역이 $\mathbb{N}_0$인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수렴과 발산
수열 $(a_n)$이 실수 $l$에 수렴하면
\[\lim_{n\to \infty} a_n = l\]로 쓰고, 이때 $l$을 수열 $(a_n)$의 극한값이라 한다.
엡실론-델타 논법(epsilon-delta argument)을 이용한 엄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lim_{n\to \infty} a_n = l \overset{def}\Longleftrightarrow \forall \epsilon > 0,\, \exists N \in \mathbb{N}\ (n > N \Rightarrow |a_n - l| < \epsilon)\]즉, 아무리 작은 양수 $\epsilon$에 대해서도 $n>N$일 때 $|a_n - l | < \epsilon$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 항상 존재한다면, 충분히 큰 $n$에 대하여 $a_n$과 $l$의 차가 한없이 작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만족하는 수열 $(a_n)$은 실수 $l$로 수렴한다고 정의한다.
수렴하지 않는 수열은 발산한다고 한다. 수열의 수렴 혹은 발산 여부는 그 수열의 유한 개의 항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만약 수열 $(a_n)$의 각 항이 한없이 커지면
\[\lim_{n\to \infty} a_n = \infty\]라고 쓰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수열 $(a_n)$의 각 항이 한없이 작아지면
\[\lim_{n\to \infty} a_n = -\infty\]라고 쓰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한다.
수렴하는 수열의 기본 성질
수열 $(a_n)$과 $(b_n)$이 모두 수렴하면(즉 극한값을 가지면), 수열 $(a_n + b_n)$과 $(a_n \cdot b_n)$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며, 이때
\[\lim_{n\to \infty} (a_n + b_n) = \lim_{n\to \infty} a_n + \lim_{n\to \infty} b_n \label{eqn:props_of_conv_series_1}\tag{1}\] \[\lim_{n\to \infty} (a_n \cdot b_n) = \left(\lim_{n\to \infty} a_n \right) \cdot \left(\lim_{n\to \infty} b_n \right) \label{eqn:props_of_conv_series_2}\tag{2}\]이다. 또한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lim_{n\to \infty} (t a_n) = t\left(\lim_{n\to \infty} a_n \right) \label{eqn:props_of_conv_series_3}\tag{3}\]이다. 이러한 성질을 수렴하는 수열의 기본 성질 또는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 한다.
자연로그의 밑 $e$
자연로그의 밑은
\[e := \lim_{n\to \infty} \left(1+\frac{1}{n} \right)^n \approx 2.718\]로 정의한다. 이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자연상수’라는 표현이 꽤 널리 쓰이고 있으나, 이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대한수학회에서 수학용어집에 등재한 공식 용어는 ‘자연로그의 밑’이며, ‘자연상수’라는 표현은 해당 용어집에서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자연상수’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으며, ‘자연로그’에 대한 사전 풀이에서 “흔히 e로 표시하는 특정한 수”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영어권과 일본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영어 기준으로 ‘the base of the natural logarithm’이나 줄여서 ‘natural base’, 혹은 ‘Euler’s number’나 ‘the number $e$’ 정도로 주로 지칭하는 듯 하다.
출처도 불분명하고 대한수학회에서 공식 용어로 인정한 적도 없을 뿐더러, 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이러한 용어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앞으로 여기서는 나도 ‘자연로그의 밑’이라고 지칭하거나 그냥 $e$라고 표기하겠다.
급수
수열
\[\mathbf{a} = (a_1, a_2, a_3, \dots)\]에 대하여, 이 수열의 부분합들로 이루어진 또다른 수열
\[a_1, \quad a_1 + a_2, \quad a_1 + a_2 + a_3, \quad \dots\]를 수열 $\mathbf{a}$의 급수라고 한다. 수열 $(a_n)$의 급수는
\[\begin{gather*} a_1 + a_2 + a_3 + \cdots, \qquad \sum_{n=1}^{\infty}a_n, \\ \sum_{n\geq 1} a_n, \qquad \sum_n a_n, \qquad \sum a_n \end{gather*}\]등으로 나타낸다.
급수의 수렴과 발산
수열 $(a_n)$에서 얻은 급수
\[a_1, \quad a_1 + a_2, \quad a_1 + a_2 + a_3, \quad \dots\]가 어떤 실수 $l$에 수렴하면
\[\sum_{n=1}^{\infty} a_n = l\]로 나타낸다. 이때 극한값 $l$을 급수 $\sum a_n$의 합이라고 부른다. 기호
\[\sum a_n\]은 상황에 따라서 급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급수의 합을 나타내기도 한다.
수렴하지 않는 급수는 발산한다고 한다.
수렴하는 급수의 기본 성질
수렴하는 수열의 기본 성질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렴하는 급수의 기본 성질을 얻는다. 실수 $t$와 수렴하는 두 급수 $\sum a_n$, $\sum b_n$에 대하여
\[\sum(a_n + b_n) = \sum a_n + \sum b_n, \qquad \sum ta_n = t\sum a_n \tag{4}\]이 성립한다.
급수의 수렴성은 유한개의 항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두 수열 $(a_n)$, $(b_n)$에서 유한 개의 $n$을 제외하고 $a_n=b_n$이면, 급수 $\sum a_n$이 수렴할 필요충분조건은 급수 $\sum b_n$이 수렴하는 것이다.